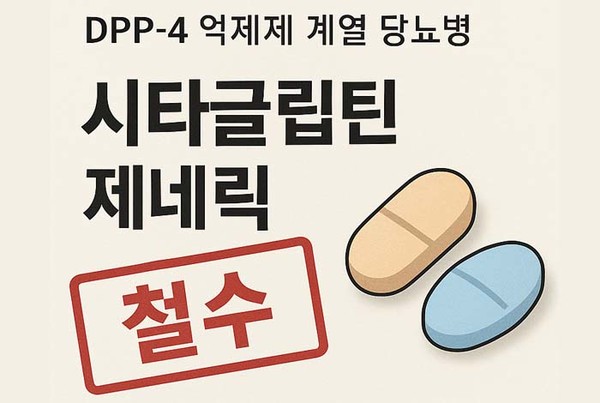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제네릭이 허가 받은 지 10년이 된 올해 시장에서 무더기 철수 중이다.
2015년 시행된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맞물려 제네릭 개발의 중심에 섰던 시타글립틴 제제는 지난 10년 간 꿈꿨던 장밋빛 미래를 뒤로 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테라젠이텍스의 '테라메트정' 3개 용량이 유효기간만료로 허가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 주에는 국제약품의 '시타비스엠정', 대한뉴팜의 '시타포민정', 위더스제약의 '글리메트정', 셀트리온제약의 '셀시타정', 동성제약의 '스타메트정', 환인제약의 '자누틴듀오정', 안국약품의 '안국시타포르민정', 메디카코리아의 '라누메트정' 등 8개사 24개 품목이 유효기간만료로 취하됐다.
이들 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시타글립틴 성분 제제 33개사 91개 품목이 유효기간만료와 자진취하를 통해 품목허가를 취하한 상황이다.
MSD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물질특허는 2023년 9월 만료됐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공세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사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려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네릭 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특허를 넘어서면 품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네릭 출시까지 가능한 모든 특허장벽을 넘는 것은 특허전략 경험이 없던 당시로써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10년 전 제네릭 개발 '붐'
2015년 당시 종근당과 신풍제약 등 30개 국내사들은 자누비아·자누메트 제네릭 132개 허가 받으며 '제네릭 개발 붐'을 일으켰다.
2019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2020년 72개 품목, 2021년 115개 품목, 2022년 254개 품목, 2023년 18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절정을 이뤘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30개사 총 808개 품목의 제네릭이 가세하며 오리지널 품목이 가진 대형시장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의 처방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330억원를 기록했다. 자누비아 391억원, 자누메트 588억원, 자누메트XR 350억원으로 확인됐다.
자누비아 품목군은 한때 1700억원대의 정점을 찍었다가 제네릭 출시로 인한 약가인하에도 2023년까지 13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00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시장규모가 큰 만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열기를 불러 일으켰지만, 장기간 출시 대기가 이어지면서 품목정리나 출시 전략 변경 등을 이유로 자진취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2023년 4월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으로 DPP-4 억제제+SGLT-2 억제제 병용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허가 트렌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규 조합·새 성분 등장 등 경쟁약물 포화상태
시타글립틴 제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11개사 31개 품목이 자진취하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단일제 및 메트포리민과의 복합제를 취하하고 다파글리플로진 또는 로베글리타존과 결합한 2제 복합제나 3제 복합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린 사례가 많았다.
실제 최근에는 다양한 조합의 2제 복합제 또는 3제 복합제 개발을 시도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성분을 결합한 신규 조합의 복합제가 개발되기도 했다.
종근당은 2015년 자누비아 제네릭 개발에 들어갔으나, 자누비아가 국내 출시하면서 2016년부터 한국MSD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했다.
MSD는 자누비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전 판권을 종근당에 양도한 바 있다. 현재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허가권은 종근당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의 허가권 양도를 종근당과 논의 중에 있다.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시타글립틴 외에도 특허가 만료된 같은 DPP-4 계열의 트라젠타(성분 리나글립틴)와 SGLT-2 계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오는 10월 특허만료 예정인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제네릭이 출격했거나 제네릭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약물이 많아 이미 포화 상태다.
의약품 품목갱신은 5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내년이 되면 올해 만큼이나 유효기간만료를 통해 정리되는 시타글립틴 제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인사이트] 2027년 지역의사제 속도전…'설계 공백' 논란에도 강행 기조](https://cdn.pharmstoday.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400494_100525_3125_1763631088_2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