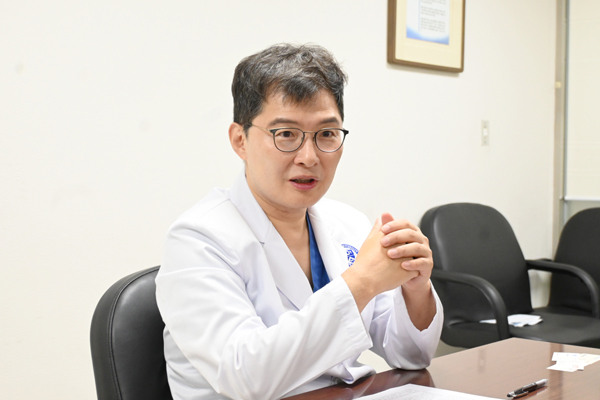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가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되면서, 파브리병으로 진단된 약 300명의 희귀질환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장 근육 두께만으로 파브리병 치료와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그루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메디팜스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최근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폴드가 2차 치료제로 남아 있었던 나라였다"며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갈라폴드는 지난 달 1일부터 급여 기준이 기존 '효소대체요법(ERT) 12개월 이상 투여 후 전환' 조건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 적용됐으며, 급여 적용 연령도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체중 45kg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일부 환자가 한달에 두 번 병원을 방문해 주사를 맞아야 했고, 사회생활과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웠다. 주사를 놓치면 2~3년 동안 치료가 끊겨 병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았다.
홍 교수는 "환자들의 이런 고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번 급여 확대는 환자들에게 진짜 큰 장점"이라면서 "삶과 치료를 동반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구제는 치료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라폴드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 중 약 25~30% 정도만 해당된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된 환자이면서 유전자 변이가 명확하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콩팥 기능 저하가 없는 경우에 갈라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처럼 조기진단과 초기 치료 중요

파브리병은 알파-갈락토시다제 A(alpha-galactosidase A)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에는 1000명~150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치료를 받는 환자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파브리병인지 모르고 평생 지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희귀병은 어릴 때 진단받지 못하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브리병은 적절히 치료하면 평생 살 수 있어 다른 희귀병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파브리병을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 방식으로 비유했다. 고혈압 환자가 합병증이 없다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파브리병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어 어릴 때부터 당이 쌓여 문제가 생기는데, 남성 파브리병 환자도 같은 원리"라며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우연히 발견…꾀병으로 오해받기 쉽상
그러나 환자 발굴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진단률은 과거보다 높아진 편이지만,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없는 환자가 많고,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갈라폴드는 이번 1차 치료 급여 확대와 함께 연령도 16세에서 12세로 낮아졌다. 심장내과에는 주로 성인 환자가 많지만, 가족력으로 확인돼 진단되는 아동 환자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7살 아동이 클래식 환자로, 10살 때부터 치료를 시작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아 평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또 다른 고등학생 환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주사 치료를 시작했지만, 학교 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후 경구제 치료로 전환하면서 학업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파브리병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클래식 형태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손끝과 발끝이 극심하게 아프고,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도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꾀병으로 오해받기 쉬운 질환으로 꼽힌다.
홍 교수는 "파브리병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미묘해 진단까지 평균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여러 과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다학제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나 병원 차원의 체계적인 다학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국립대 병원에서 희귀병 관리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사립병원은 지원이 거의 없고 병원 자체에서도 환자 수가 적어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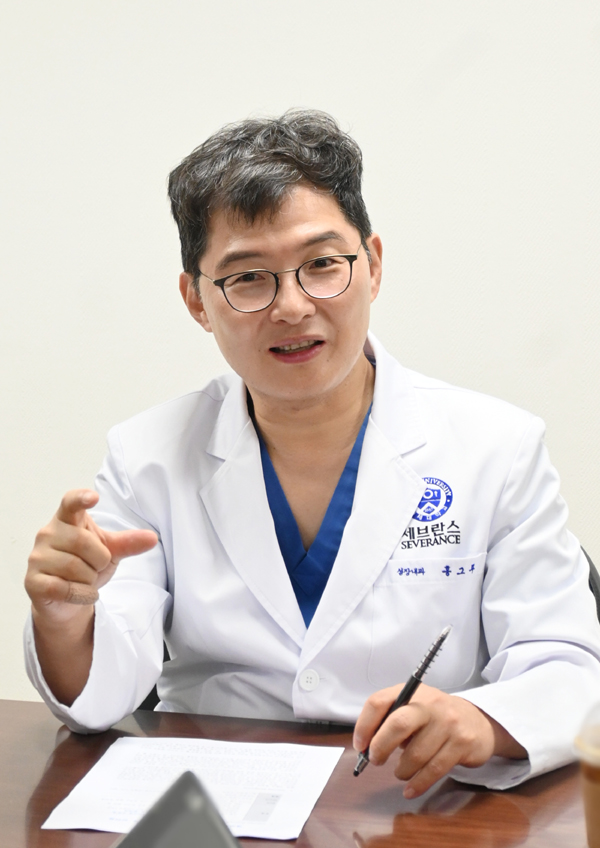
파브리병, 심장 두께로 치료 제한하는 것이 '비정상적'
또 하나의 문제로 치료 시기를 꼽았다. 심장 두께로 치료와 급여 적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파브리병 조기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심장 근육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도 보통 가족력이 없으면 15㎜ 이상, 가족력이 있으면 13㎜ 이상일 때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한다"며 "문제는 비후성 심근증도 유전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벽 두께만으로 병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심장 근육 벽은 운동을 하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판막 질환 여부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두꺼워질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심장 벽 두께는 이완기 기준으로 보통 7~8㎜ 정도다. 나이가 많은 고혈압 환자는 10㎜ 이상이 되어도 흔하지만, 젊은 사람의 심장 벽이 10㎜ 이상이라면 비정상으로 인식된다.
홍 교수는 "어린 나이는 병력이 짧고 다른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정상보다 약간만 두꺼워져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파브리병은 12㎜ 이상이어야 보험 적용과 치료가 가능하고 10~11㎜는 치료가 제한된다"며 "심장 두께 자체보다 나이와 표준 편차를 고려해 비정상일 때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 기준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책 인사이트] 2027년 지역의사제 속도전…'설계 공백' 논란에도 강행 기조](https://cdn.pharmstoday.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400494_100525_3125_1763631088_2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