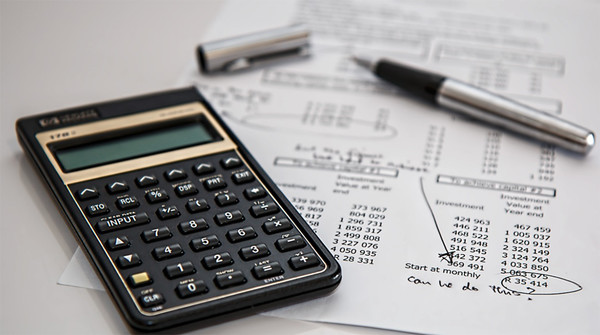
올해 1분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5곳 중 3곳 가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원가율 낮아져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은 종근당바이오와 GC녹십자 등은 매출 부진과 함께 매출원가율이 상승했다. 반면 제일약품과 명문제약은 매출 성장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낮추는데 성공해 대조를 보였다.
메디팜스투데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023년 분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0개사의 매출원가율을 살펴본 결과 평균 58.4%로, 전년 동기 59.3%에 비해 0.9%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개사의 전체 매출액 6조 7625억원 중 3조 9509억원이 매출원가에 해당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했으며, 매출원가는 7.2% 늘어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50개사 중 매출원가율이 감소한 곳은 30곳으로, 집계된 기업 5곳 중 3곳이 수익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실제 매출원가 자체가 감소한 곳은 그보다 적은 15곳에 불과해, 매출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매출원가율은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통 매출원가비율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매출원가에는 제품 원료·구매비용, 임금 등 직접원가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간접원가까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이나 수액제 비중이 높은 기업, 상품비율이 높은 기업 등이 매출원가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

50개사 중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92.9%에 달하는 종근당바이오로 나타났다. 종근당바이오의 수출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82.9%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제품가격이 환율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요 원료의약품 원재료 가격은 전년 동기 kg당 평균 1만 5804원에서 올해 1분기 2만 7024원으로 1만원 가량 상승했고, 주요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가격도 전년 동기 kg당 1만 3470원에서 1만 8425원으로 3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광동제약 79.5%, 경보제약 73.5%, JW생명과학 72.9%, GC녹십자 71.5%로 5개사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GC녹십자는 매월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으나, 매출액이 16.2% 크게 줄면서 매출원가가 6.4%p 높아졌다.
또 제일약품 69.6%, 유한양행 69.4%, 영진약품 69.3%, 셀트리온제약 69.5%, 한독 67.8%, 대한약품 65.6%, 한미약품 63.6%, 일동제약 63.0%, 종근당 62.9%, 대화제약 62.5%, 삼일제약 61.8%, 보령 61.1%, 신풍제약 60.4%, 삼진제약 60.0%, 유유제약 59.7% 등 총 20개사가 평균 매출원가율 58.4%보다 높았다.
제일약품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매출원가가 감소하면서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p 낮아져 70% 이하로 끌어내렸다. 일동제약은 매출원가를 8.2% 줄였으나, 매출액이 8.5% 감소해 매출원가율은 다소 상승했다.
반면 휴젤은 매출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p 하락한 22.2%로 집계된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안국약품 36.7%, 하나제약 37.2%, 알리코제약 38.9%, 동구바이오제약 39.4% 등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팜젠사이언스는 매출액이 8.2% 감소했으나, 매출원가가 22.6% 급감하면서 매출원가욜이 7.8%p 낮아졌다.
제품매출 원가는 전년 동기 12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상품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80억원에서 27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다.
명문제약은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매출원가가 5.6% 감소해 매출원가율은 9.7%p 가장 많이 하락했다.
명문제약은 영업대행(CSO)으로 판매 체계를 전환해 지급수수료가 증가했지만, 급여 감소와 매출 상승이 이를 만회해 수익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인사이트] 2027년 지역의사제 속도전…'설계 공백' 논란에도 강행 기조](https://cdn.pharmstoday.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400494_100525_3125_1763631088_2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