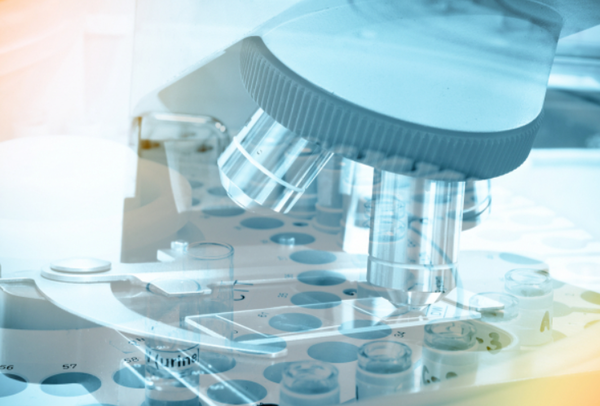
디지털병리 시장이 의료의 디지털화 및 임상연구 병리진단 수요 증가에 따라 신 성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디지털병리 산업의 변화를 분석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디지털병리 산업 동향’ 브리프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디지털병리(digital pathology)란 세포 및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고배율의 이미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병리학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즉각적인 영상 공유 및 개선된 협업을 제공 ▲인공지능 사용 가능 ▲의학적 현신 제공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병리학자의 신체적 부담 완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은 2020년 7억 443만 달러에서 2026년 12억 7764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평균 10.43%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병리의 촉진 요인으로 의료의 디지털화,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서비스 사용 증가, 임상연구에서의 디지털병리 적용, 실험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병리 채택 증가 등을 꼽았다.
더불어 신약개발 및 동반진단 분야에서 디지털병리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주로 암 치료에 적용되는 개인맞춤의학과 정밀의학이 의학의 핵심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병리 솔루션에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딥러닝(DL) 및 머신러닝(ML) 도구를 사용한 슬라이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응용 분야별로는 학술 연구 및 교육, 질병 진단 및 컨설팅, 신약 발견 및 개발 분야로 세분화되며, 현재는 학술 연구 및 교육의 비중이 전체 시장의 48.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질병 진단 및 컨설팅 부문과 신약발견 및 개발 부문은 2020년 각각 27.2%, 24.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신약 발견 및 개발 분야에서는 암 치료를 위한 정밀 의약품 개발에 디지털병리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AI·ML과 결합해 종양 샘플에 대한 병리학적 평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디지털병리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구현이 어려우며, 디지털 영상 및 디지털 보관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할 경우 운영 지침에 대한 혼돈으로 인해 인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업체들도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 포지션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병리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인사이트] 2027년 지역의사제 속도전…'설계 공백' 논란에도 강행 기조](https://cdn.pharmstoday.com/news/thumbnail/custom/20251126/400494_100525_3125_1763631088_280.jpg)



